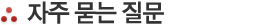'머리를 깍는다'는 말의 정확한 용어는 체발제수(剃髮除鬚)입니다. 범어 mundana의 번역어인 체발제수는 면상에 국한하여 시행하되 삭발 뿐만 아니라 면도도 포함하는 불교용어로, 삭발(削髮)·낙발(落髮)·축발(祝髮)·체두(剃頭)라고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인과경(因果經)』에는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시는 때, 스스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시고는, "내 이제 세속사람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일체 번뇌(煩惱)와 습인(習因)을 단제(斷除)하겠노라" 하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시대와 지방을 막론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르는 것으로 재가자의 기본적인 모습을 삼습니다. 이것을 '재가자의 모습' 즉 재가상(在家相)이라 부르는데, 출가는 이같은 재가의 풍습과 반대하여 세속과의 인연을 단절하고 수도하는 '출가자의 모습' 즉 출가상(出家相)을 구현하기 위해서 체발제수라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또 그 유래는 역사적으로 석가세존의 출가상에서 비롯합니다.
단적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은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신분을 상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의 머리라든지 또는 구레나룻이나 카이저수염이라든지 하는, 소속과 신분에 따라 이발 모습의 형태적인 변화가 다소나마 남아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이같은 풍조가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삭발은 이 점에서 출가자의 사회적 계급을 박탈하여 출가자 사이에 신분의 평등을 구현한다는 부수적인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출가자의 아만(我慢)을 제거하기 위해서다고 삭발의 부수적인 기능을 간략히 정의합니다.
삭발은 보통 '반월차삭발(半月次削髮)'이라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가자가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어느 한 쪽이라도 고의적으로 기른다면 이는 출가상을 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스님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체발제수는 계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불교의 중요한 제도이며 스님의 고귀한 의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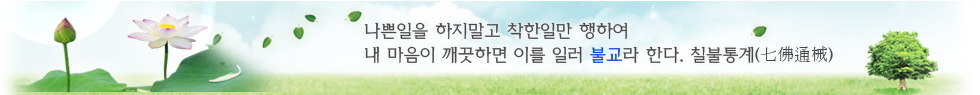
 Home >커뮤니티 > 자주 묻는 질문
Home >커뮤니티 > 자주 묻는 질문